
왼쪽부터 빈티지 바카라 글라스, 리델의 위스키 잔, 출처를 알 수 없는 빈티지 글라스, 키무라 글라스의 마티니 잔.
패션의 마무리가 슈즈라면, 좋은 술의 완성은 제대로 된 술잔이다. 요컨대 충분히 복합적인 맛과 향을 지닌 와인을 중세 시대의 드레스처럼 넓게 퍼진, 잘 만든 부르고뉴 형태의 잔에 담아 마셔보면 범용 글라스에 따라 마시는 향과 큰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이를 단 한 번이라도 느끼게 되면, 그 차이를 모르던 때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누군가는 유난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알게 된 그 작은 차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이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보통은 술잔의 형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데, 내게 잔의 형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잔이 내 입술에 영향을 미치는 촉각 조건이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잔에 입술이 닿는 부분이 와인의 온도를 입술로 먼저 느낄 수 있을 만큼 얇아야 한다는 점, 둘째는 입술과 혀에 닿는 와인 잔의 림(rim)이 둥글게 말려 있지 않고 예리하게 잘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쉽게도 그런 와인 잔을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는 그리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잔을 만날 때마다 사 모으는 게 나의 조그만 럭셔리인 셈이다. 문제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글라스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수의 글라스하우스들이 기계화된 대형 공장을 확장하고, 핸드메이드 공정이 이뤄지는 공장을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으로 옮기고 있다. 그 결과 와인 잔들의 스템과 림은 점점 두꺼워지고, 림의 끝은 조금씩 뭉툭해져 왔다. 오래전 오스트리아의 글라스 공예 작업실에 방문했을 때 용광로 앞에서 한 백발의 장인이 웃통을 벗은 채 시뻘건 액체 유리로 작업하는 걸 보고 기겁했던 적이 있다. 21세기의 기술 선진국에서 그런 위험천만한 수작업을 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잔은 대부분 크리스털로 만드는데, 크리스털을 보통의 유리보다 투명하고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산화납이다. 여러 국가에서 유해물질 논란이 일어 산화납 사용을 금지했다는 사실 역시 내가 사랑하는 잔들을 앞으로 점점 더 만나기 힘들어지게 만드는 위험 요소다. 제조 방식의 규제가 완화되며 그 맛이 변하고 있는 위스키, 기후변화 탓에 테루아의 특징을 잃어가고 있는 와인들과 함께 얇고 예리하게 커팅된 핸드메이드 글라스 역시 이제는 ‘어쩌면 잃어버릴지 모르는 즐거움’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보이는 대로 사고, 모으고, 아껴서 보관하는 수밖에 없다.
임동혁(소이연남·영동포차나·툭툭누들타이 대표)

거의 매일 차를 마시며 감상하고 있다는 양병용 작가의 나주반. 의뢰 후 1년이 넘게 기다려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3년 전 생일 때 남자 친구가 양병용 작가의 나주반을 선물로 줬다. 그건 마치 우리가 사과를 떠올리면 둥근 원형과 짧은 꼭지를 떠올리듯, 우리가 ‘나주반’이라는 단어에서 연상할 만한 형태의 원형에 무척 근사한 물체였다. 반(천판 혹은 상판)에 소박한 변죽(상판 옆에 있는 꺾인 부분) 장식이 붙어 있고, 상판 아래에는 단 두 개의 곡선으로 꾸민 소담한 운각이 붙어 있고, 두 다리 사이에는 꺾임 없이 곧은 중대가 가로지른 그 소반은 마치 나주반이라는 단어를 기호화한 듯 소박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비 같고 검소한 모양새는 당시에 내가 살던 집의 실내 장식과는 어울리지 않았으니, 나는 이 아름다운 나주반을 소중하게 보관만 해두었더랬다. 그러다 ‘이 소반에 어울리는 집을 구하자’라는 생각이 든 건 정말이지 문득이었다. 그전까지 집을 소유하지 않았던 건 소유 그 자체에 회의적이기도 했고, 내가 싫증을 빨리 내는 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하여튼 지금 사는 집의 실내 장식을 할 때는 이 나주반에 어울릴 만한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소반 위에서 차를 내려 마시며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소반을 감상한다. 양병용은 소반을 만들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포를 대지 않았다. 대패로 마무리한 거친 표면과 그 위에 칠한 얇은 옻칠을 손으로 만지며 느껴본다. 나무로만 끼워 맞춰 동 소재만으로 완성한 완결성에 감탄한다. 언뜻 차가워 보이는 직사각형의 상판이지만 변죽 모서리에 작은 곡선을 둘러주니 이렇게 따듯해지는구나, 라고 감탄도 해보고, 다리와 다리 사이를 잡아주는 중대를 잡아 흔들어보며 언뜻 유약해 보이지만 낭창거려 오히려 강인하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깨닫기도 한다. 단아하다는 말에 대해, 드러나지 않는 품위에 대해 생각하며 가끔은 이 소반의 아름다움을 닮고 싶다고 느낀다.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색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매력이다.
박세준(스타일리스트)

철필로 펜드로잉과 캘리그래피를 하는 최성희 대표가 수집한 펜과 닙들. 넓적한 형태의 닙은 오선지를 그리는 용도라고 한다.
늦은 저녁 조용한 책상에 앉아 잉크병 뚜껑을 하나씩 열고 딥 펜(dip pen)을 꺼내 이런저런 펜촉(pen nib)들을 펜대(holder)에 갈아 끼우다 보면 어느새 방 안에 잉크 향이 차분히 깔린다. 잉크 향은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른데 바이레도가 잉크 향이라 표현한 ‘엠/엠잉크(M/MINK)’의 향보다는 실은 좀 더 단순하고 소극적이다. 그리고 난 그 소극적이고 단순한 향을 좋아한다. 특히 빈티지 잉크들을 사용할 때면, 눈을 감고 잔향을 느끼며 사라진 향들을 상상한다. 잔향을 조금이라도 더 깊게 느껴보기 위해 호흡을 길게 모아 천천히 마셔보기도 한다. 우리가 펜촉이라 부르는 부위의 영어 명칭은 ‘닙(nib)’이다. 닙은 잉크를 머금는 홀(hole)과 몸통이 가늘어지기 시작하는 숄더(shoulder) 그리고 지면에 닿는 팁(tip)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형태가 무척이나 다양해 수집 욕구를 자극한다.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펜촉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종이 위를 지나가며 진가를 발휘한다. 필압도 중요하지만 어떤 잉크 또는 어떤 종이와 만나느냐에 따라 방 안의 습도에 따라 사각거리는 소리도 다르고, 닙에 따라 선 두께와 번짐의 모양이 다르다. 어떤 조합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선으로 다양한 글씨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셈이다. 조합에 따른 펜 닙의 감도가 어찌나 멋진지,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도 있다. 철필(Steel Pen)은 1800년대 초반 영국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들다가 1823년경 존 미셸, 조지아 메이슨이 영국의 버밍엄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내가 가진 이탈리아의 금속장인 주세페 라비니의 피오레라는 브랜드는 1830년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시작되었으니 이탈리아 강철 펜의 거의 시초인 셈이다. 유연하고 정확한 필기가 가능했던 피오레 강철 펜은 당시 주로 쓰이던 거위 깃털 펜을 빠르게 대체하며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만년필이 보급되며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런 펜 닙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나의 작은 럭셔리다. 여행지에서 생산이 중단된 빈티지 펜촉들을 찾아 오래된 문구점과 화방을 뒤진다. 수년 전 밀라노 골목에서 피오레 펜촉과 코발테아 펜촉이 가득 들어 있는 아름다운 빈티지 박스를 발견했을 때 어찌나 기뻤던지. 망설임 없이 사온 그 펜촉들이 작은 박스 속에 수십 개가 넘게 남아 있어 든든하기 이를 데가 없다. 세상은 바야흐로 스마트폰 시대. 누군가에게 철필은 무용한 것인지도 모른다. 유용한 것과 무용한 것들이 자꾸 혼란스러운 시절. 그러나 클래시컬한 도구로 과정의 생략 없이 나만의 일상을 채워가는 것이 내게는 여전히 유용한 즐거움이다.
최성희(켈리타앤컴퍼니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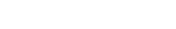







 BY
BY
 brand
br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