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노리의 여행 일지
」
프랑스 디자인 듀오 이시노리
얼마 만의 서울 방문인가?
2년 만이다.
〈루이 비통 트래블 북〉 서울 편을 그리기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을 오간 것으로 안다. 그 작업 이후 오랜만의 방문이다. 그사이 서울의 변한 모습이 있나?
엊그제 도착해서 아직 우리가 잘 아는 장소를 둘러볼 시간이 없었기에 잘 모르겠다. 내일 홍대 쪽으로 나갈 예정이라 거기선 무언가 변화를 느낄 것 같다. 워낙 빨리 변하는 곳이니까.
‘잘 아는 장소’라면 아무래도 이번 서울 편에 실린 홍대, 광화문, 명동, 강남, 성수동을 말하는 걸까? 특별히 이 장소들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협업한 루이 비통에서 필수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다. 예를 들면 고궁이라든지 동대문, 남대문 그리고 성곽 같은 곳.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받았다. 서울의 ‘스피릿’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한 곳들이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동네나 풍경이 있다면?
굉장히 많다. 문래동도 좋았고 을지로3가의 인쇄소 거리도 인상 깊었다. 아마 이제 곧 사라질 풍경이라 생각해서, 사라지면 많은 분들이 그리워할 것 같아서 특히 더 기억에 남는다. 통인시장이나 노량진 수산물 시장도 굉장히 좋아한다. 프랑스인의 시선으로 다른 도시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이국적이라 생각되는 장소에 끌린다.
서울 사람보다 더 서울 곳곳을 다녀본 듯하다.
우리가 좋아한 장소들이 아마 아주 아름답고 멋진 곳은 아닐 거다. 서울에는 멋진 바나 부티크가 많은 거리도 있다. 그러나 그런 풍경은 다른 대도시와 너무나 비슷하다. 우리는 서울에만 있는 것, 유니크한 것, 그런 모습을 더 다루고 싶었다.
특히 ‘Rush in a metro station’이라는 작품에 웃음이 났다. 선으로 그린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머리 군집’만으로 복잡한 서울 출퇴근길 지하철 모습을 표현해냈다. “평소 마유미가 작업하면 라파엘이 지우고, 라파엘이 지우면 마유미가 다시 작업을 이어나간다”라고 말한 작업 방식이 이해되기도 했다. ‘지운다’는 것은 ‘덜어낸다(단순화한다)’는 말 같아서.
그 그림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그렸고 훨씬 복잡했는데 그 지역이, 그 장면이 가진 에너지를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많은 걸 지워냈다. 너무 많은 걸 그리다 보면 이 장면에서 무엇을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리고 있었던 건지 메시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러지 않으려고 지워낸다. 우리는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다 보니 서로 이미지를 통해 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우리 노트를 보면 정말 많은 걸 그려놓지 않았나. (마유미와 라파엘 각자의 앞에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그 노트에는 검은색 펜으로만 묘사한 물건이 빼곡했다.) 이렇게 많은 걸 그려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필수적인 것만 보여주기 위해 지우는 작업을 한다.
지금 그리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라파엘은 자유롭게 드로잉한다면 마유미는 자를 대고 그리고 있다.
(웃음) 우리는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한다고 생각한다. 작곡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이 그림(트럭을 그린 ‘Street vendor trucks, Insa-dong’을 보여주며)의 경우 트럭을 넣자는 이야기는 내가(라파엘) 했던 것 같다. 마유미 보고 그려보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 완성 작업은 내가 했다. 악기를 가지고 작곡을 할 때에도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해보고 그것이 조화가 잘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악보로 완성하지 않나.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한 다음 서로 어우러지는 정확한 음을 만들어낸다.
그림 그리는 스타일을 보니 마유미는 현악기일 것 같고, 라파엘은 타악기일 것 같다.
어떨 땐 반대로 칠 때도 있다. 내가(마유미) 타악기를 ‘때릴 때’도 있다.(웃음)
작업 스타일만큼 여행 스타일도 다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림을 그릴 때는 서로 손 제스처마저 다르다. 그럼에도 둘이 같이 작업을 하면 마치 제3의 사람이 그린 것 같다. 우리 둘이 한 게 같이 녹아들어 나온 작업이 말이다. 우리의 ‘보스’는 이시노리다. 우리는 이시노리를 위해 작업한다.
‘제3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제3의 자아’라고 이해해도 될까?
그렇다.(웃음) 이시노리는 우리 둘의 제3의 자아다.
이시노리는 간결한 색채와 선으로 대상을 묘사한다. 이시노리가 포착한 서울의 면면들
」
Rush in a metro station © LOUIS VITTON MALLETIER / ICINORI

Street vendor trucks, Insa-dong © LOUIS VITTON MALLETIER / ICINORI

Relaxation at Jjimjilbang © LOUIS VITTON MALLETIER / ICINORI

Apateu danji facade © LOUIS VITTON MALLETIER / ICINORI
이번 서울 편 작업에 대한 메이킹 영상을 봤다. 라파엘의 이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경험을 그림으로 온전하게 그린다거나 또는 그림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보통은 ‘그게 가능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렸다’라고 어필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나 열심히 서울을 그렸지만, 이 그림을 통해 서울을 온전히 공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한 말이 신선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이 도시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서울에서 사는 방식은 각기 다르지 않나. 200페이지에 불과한 책을 통해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완전히 전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한국 영화 중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서울은 정말 독특하다. ‘서울에 이런 데가 있었어?’ 싶은 시선을 전한다. 같은 서울이라도 각자가 다 다른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경험을 그림으로 온전하게 그린다거나 그림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는 서울의 골목이나 뒷면이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홍상수의 서울과 이창동의 서울은 같은 곳이 아닌 것 같다. (라파엘에 이어 마유미가 말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우리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옥상마다 김치 항아리가 많은 걸 보았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서울 사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도대체 어디에 김치 항아리가 있느냐고 하더라. 서울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지.(웃음)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 눈에는 김치 항아리만 보인다.
이 책을 보며 포스트잇을 붙여둔 지점 역시 그런 부분이었다. 서울에 사는 나조차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싶은 그림들. 가령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그린 건 줄 알았더니 제목이 ‘Relaxation at Jjimjilbang’이더라. 폐품을 실은 손수레는 마치 콜라주 작품 같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도 그렇다. (라파엘이 트럭 그림 속 돌을 올려둔 플라스틱 의자를 짚으며) 사방에 많다. 안 보이지, 이런 거? 플라스틱 의자 위에 무언가 놓여 있는 모습. 그런데 외부인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신기해 보인다.
파리에서는… 안 그런가?
절대로.(웃음) 마치 조각 작품 같다. 이것도 서울 사람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전선도 굉장히 많이 얽혀 있다. 건물을 보면 어떤 선이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고, 밧줄이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얽힌 선 역시 굉장히 신기했다. 루이 비통이 서울 편 작업을 의뢰하며 요청한 게 ‘서울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대상을 재발견하게끔 만드는 새로운 시선은 타국에 가면 저절로 보이는 걸까? 대상을 바라보는 이시노리만의 시선과 방식이 있는 걸까?
아마 두 가지 면이 다 있지 않나 싶다. 보통 외국에 나가면 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지 않나. 자동차 색깔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걷는 모습은 어떤지 신경 써서 본다. 그래서 외국에 가는 건 마술 세계에 발을 딛는 일 같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익숙해지면 마치 우리 집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다시는 서울을 처음 찾은 여행자가 될 수 없다는 거다.
10년 후에 오면 새로울 거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서울은 2년이면 될 것 같다.(웃음)
그런데,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질문과 대답이 통역되는 사이 틈틈이 계속 그림을 그리던데 무엇을 그리는 건가?
눈앞에 보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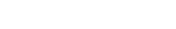







 BY
BY
 brand
br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