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하자. 양식 셰프들이 한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실 뒤늦은 시도다. 이미 벌써 시작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물론 여전히 한식은 소매가 풍성한 한복을 입은 요리연구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여기서 한식에 도전하는 셰프들이란 전통적인 한식(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요리를 하던 셰프들을 지칭한다.
사실 요리에는 어떤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 오븐과 브로일러와 플랫톱에 전자식 샐러맨더를 쓰는 셰프가 김치와 국이 놓인 밥상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한식이다. 한식이란 참 묘하게도 무엇이 한식이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 “에이, 저건 한식이 아니야”라는 판단도 힘들다. 임정식 셰프가 취나물이 섞인 빵을 내고 김치 국물을 소스로 쓰는 스테이크를 낼 때, 우리는 그것이 한식인지 아닌지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강민구 셰프가 된장과 고추장을 넣은 디저트를 낼 때 그 정체성에 대해 말하자면 조선조의 예송 논쟁이 따로 없을 것이다. 당신이 내게 묻는다면? 분명한 건 아침에는 ‘예스’, 저녁에는 ‘노’라고 말하리라는 것이다. 나도 모른다. 당신은 아는가?
김치볶음밥은 한식인가? 김치라는 빼도 박도 못할 한식과 볶음밥이라는 중국식의 이종교배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부대찌개는 한식인가? 강낭콩과 체더치즈에 미국인 병사의 이빨 자국이 있는 소시지가 들어간, 거기에 일본인이 발명한 라면 사리를 더한 그 김치찌개류를 분류해내기 위해 국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문화인류학자와 식품학자, 역사학자에다가 얄타회담의 주인공들에다가 어쩌면 르네 지라르와 찰스 다윈을 불러야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쩌면 한식이라는 건, “옛소, 이게 한식이오” 하면 성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적어도 나의 견해다. 임정식과 강민구 두 셰프가 그렇게 주장하듯 말이다.
임정식 셰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그 속내를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는 ‘진짜 한식’을 생각하는 것 같다. 냉면과 국밥과 어복쟁반을 팝업 형태로 내놓는 걸 보면 그런 판단이 더 뚜렷해진다. 여전히 사람들은 요리란 손맛이며 한식은 어머니의 부뚜막이라 떠올린다. 아궁이와 가마솥, ‘3대째 대물림’이라는 신화에 깊게 경도된다. 요리란 화학적 교합을 넘어 정서적으로 소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런던이나 뉴욕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홈메이드’가 간판에 쓰인다. 어쩌면 임정식 셰프는 그 경계에 놓인 세대의 요리사다. 그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지 않았을 것이며, 미국에서 요리를 배웠고,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는 데 익숙한 인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거론했던 오븐과 플랫톱으로 가마솥과 번철을 대신하는 세대의 등장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과학적으로 요리를 배운 세대들이 한식 시장에서 활약할 게 분명하다. 한식은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요리학과 졸업생 중 한식 전공자는 격년으로 배출됐다. 어떤 해에는 지원자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건 실화다. 이제는 아예 한식을 하겠다고 요리학과를 들어오는 학생이 늘었다. 일시적인 유행은 아닌 것 같다. 양식을 전공한 후 한식을 표방해 성공한 여러 셰프(앞선 두 인물이 그 선두 주자다)의 모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양식 전공자이면서 일찌감치 본격 한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미슐랭 별 두 개를 받은 권우중 셰프는 다른 면에서 조명해야 할 인물이다.
나의 좁은 경험과 소견으로도 한식은 여러 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치찜은 얼마든지 오븐으로 요리할 수 있으며, 매번 다른 요리를 하느라 화덕 여러 개를 낭비하는 것보다 플랫톱을 쓰는 게 나을 수 있다. 심지어 나는 냉면에 수비드한 돼지 등심을 얹어내는데 평판이 나쁘지 않다. 덜 익은 것처럼 보이는 그 분홍색 고깃점에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독자들은 믿어지는지!(혹시라도 모르는 독자들께 밝히자면, 나는 광화문에 여러 달 전에 국밥과 냉면을 파는 집을 열었다. 물론 나는 요리를 직접 하지 않는 대신, 조리법을 짜고 요리 과정 전체를 기획한다. 요리사란 때로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일할 때도 있다.)
앞으로 한식이 아니라 한국 요리는 더 많이 변할 것이다. 아무도 한식을 정의하지 않는 동안에도 꾸준히 움직여온 미식의 흐름 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섰다. 한식에 치즈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퓨전으로 분류하는 건 관료적 발상이다. 처음으로 설렁탕에 대파를 넣은 건 1900년대 초반의 서울 설렁탕집 주인들이었다. 그것은 본디 산둥성 출신의 화교 노동자들이 쓰는 재료였고, 희한한 채소일 뿐이었다. 감자와 옥수수와 가지와 토마토를 한식 재료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80년 된 노포 냉면 국밥집과 신세대 요리사가 만들어낸 맛이 대충돌하고 있는 서울은 이제 미식의 다른 경지를 열어갈 것이다.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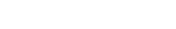







 BY
BY

 brand
brand